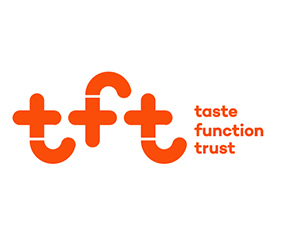아내는 새로 이사 갈 집의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뷰(view),
둘째: 좋은 전망,
셋째: 뷰!
집에 대한 아내의 이러한 확고한 생각이 여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갖게 했다. 이사를 결단하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이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서울에서 몽골까지 산 넘고 바다 건너온 거리가 얼마인데 그 짐을 다시 싸야 하다니…. 나보다 아내의 부담이 훨씬 클 것이다. 그런데 집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린다. 게다가 계약할 때마다 매번 세를 올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렇지 않아도 낯선 외국생활 채 익기도 전에 좌초되겠다 싶어 ‘다시는 이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잡고 결단했다. 더구나 서울과 비교해 몽골 생활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은 멋진 풍광!

셋집이 아니라 아예 새로 분양하는 전망 좋은 곳을 큰맘 먹고 먼저 찾아보았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위 말하는 로열층! 그런데 이게 무슨 계산법인가? 모든 층이 방향과 관계없이 오직 면적에 의해서만 단가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몽골은 참 이상한 나라다. 그렇게 우린 아내의 바람대로 전망 좋은 집을 얻게 되었다.
지금도 눈앞에 펼쳐진 멋진 산을 배경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구름! 시시각각 넓은 하늘을 가득 채우는 빛의 향연에 감동하고 있다. 그렇게 창문 넘어 변하는 풍광에 얼마 전 홍콩 출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겹쳐진다. 사람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 홍콩 타이쿠싱 뒷산 마운틴 버틀러에 제자들과 함께 올랐다. 산이 높아지고 경사가 가팔라질수록 건물들이 깊은 어둠 속에 쭈삣 드러났다. 인공 불빛의 디테일이 선명하다. 산을 오르는 목적 자체가 사진 촬영을 위한 것이다 보니, 보이는 것들을 사진기의 눈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마치 거대한 사진기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잠시 멈춰 먼 야경을 맨눈으로 내려다보니 얼마 전 문체·외통·지경부와 중앙일보 주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홍콩의 야경이 그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 걸린 작품의 오브제 같았고, 산을 오를수록 작품 앞에서 눈을 떼지 않고 뒤로 물러서며 원근감의 각도를 확인하고 있는 듯했다.
사진은 그렇게 빈 공간에서 시작된다. 그 어둠상자에 만들어진 빛의 통로를 이용해 원하는 이미지가 잘 드러나도록 거리를 맞추고 또한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리고 셔터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섞이고 호환된다. 그런 이론의 변수를 잠시 내려놓으면 사진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휘된다. 사실 사진기라고 불리는 ‘카메라’의 어원은 ‘비어 있는 방’이다.
사진기에 맺히는 영상과 산 위에서 촬영한 홍콩의 야경, 지금 내 집의 창을 통해 보고 있는 구름, 그리고 용산전시장의 중앙아시아의 풍광들이 서로 엇갈려 겹쳐진다. 한쪽은 일정한 비율로 축소되었고, 다른 편은 빛을 모으고 모아 작은 점을 통과시켜 얻은 좌우상하가 바뀐 이미지들이다. 하나는 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사진기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 둘이 마치 같은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소실점을 통과했나 안 했나의 차이가 엄연하다.
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이 밝은 곳의 축소된 세상이라면, 사진은 렌즈로 수렴시킨 점을 통과시켜 어두운 사진기 안에 거꾸로 맺힌 필름에 담아낸 상인 것이다.
함철훈(咸喆勳) >> 사진가·몽골국제대학교 교수
1995년 민사협 초청 ‘손1’ 전시를 시작으로,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