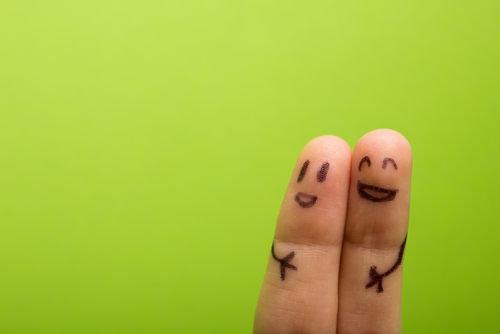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복되는 생활패턴에 생체리듬은 자꾸만 다운되고, 먹고 바로 자는 버릇 때문에 내장지방은 쌓여만 가니 반갑지 않은 배만 불룩 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한번 길들여진 육체는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는다. 오늘은 큰맘 먹고 집을 나선다. “기필코 운동을 시작해야지…” 집을 나서자 거센 바람이 몰아쳐 으스스 한기가 느껴지는 바람에 황급히 되돌아가 바람막이를 걸치고 나왔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는 달은커녕 별님조차 보이지를 않은 채 먹구름만 잔뜩 끼었다.
백운산 숲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느새 어둠이 장막처럼 내려와 코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했다. ‘휘리릭~’ 다소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우수수~ 흔들리니 섬뜩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내려간다.
‘저벅저벅, 달그락 달그락’ 고요한 적막을 깨고 필자의 발자국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진다. 초입(初入)을 지나 한참을 올라가니 산비둘기 구구대는 소리에 이어 ‘소쩍소쩍’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잃어버린 추억을 살려낸다. “아~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쩍새 울음소리이던가!” 정겨움이 샘솟는 한편 짙은 어둠속으로 진입하는 낮설음에 순간 무서움이 엄습한다. 더구나 올라가는 중간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는데, 교육보조재료로 설치 해 둔 시설물들(모조집, 동굴, 돌무덤, 적군의 형상 등)이 어둠속에서 불쑥 불쑥 나타나니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쫄깃해졌다. 발걸음은 빨라지고 어느새 등줄기에서는 송골송골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백운산 중턱 어디쯤에 필자의 고향친구가 살고 있다. 이곳에서 태어난 친구는 필자와는 초등학교 동기동창인데, 졸업 후에 한동안 왕래를 하지 못했다. 필자가 전·후방 각지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 친구는 고향의 터전을 지키면서 살았다. 드디어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친구의 집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가 있었다. 밤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온 필자를 친구는 반색을 하며 맞아준다. 사실 산속에서 저녁 아홉시쯤이면 한밤중이나 다름없는 시간인데도 스스럼없이 반겨주는 친구가 고마웠다. 잠시 땀을 식히며 친구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다. 얘기꽃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깊어가는 시간에 마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다시 오마” 작별을 하니 거실 한 귀퉁이에 캐다 놓은 햇감자 한바가지를 봉지에 담는다. 많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극구 사양하는 필자에게 가득 한 봉지를 담아 배낭에 넣어준다. 밭에 금세 나가 이것저것을 뜯어다 줄 기세인 친구를 뒤로 하고 황급히 하산(下山)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이 산속에서 닭이며 염소를 키우는데, 필자에게 주말쯤에 미리 전화를 하고 올라오면 토종닭 한 마리를 잡아놓겠다고 신신당부를 한다. 내려오는 내내 어린 시절 친구의 따뜻한 정이 마음속을 촉촉하게 적셔준다.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숲으로 들어간 필자에게 어둠속에서 들려오던 소쩍새 울음소리는 멀리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어 좋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적막한 산길을 홀로 걸어보니 태고적 신비를 체감할 수 있어 또한 좋았다. 뭐니 뭐니 해도 가진 것 아낌없이도 주고 싶어 하는 친구의 따뜻한 정과 마음을 얻었으니 이 또한 큰 행운이 아니던가, 이제부터라도 가끔씩 어둠이 짙게 깔린 숲으로 들어가 보아야겠다.




![[카드뉴스] 손주 키워봤다면? 시니어 추천 일자리 5](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028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