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극을 교육 가치로 꽃피우다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
- 연극을 보면서 울고 웃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나 이곳에서는 좀 다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와 나를 알아간다. 배움의 영역에서 연극의 역할을 알차게 사용하는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를 찾아갔다.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내의 몸짓교실.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이하 재미사마)의 신체 및 이미지 훈련 워크
- 2020-01-23 10: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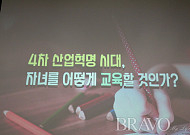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 주민을 위한 작은 복지관 커뮤니티 센터 지난 12월 23(월) 오후 7시부터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 안의 도심형 요양원인 KB 골든라이프케어 위례 빌리지 커뮤니티 센터(주민 사랑방)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특강이 있었다. 올해 9월에 개관한 커뮤니티 센터는 1층에 위치한 넓고 채광이 좋은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개
- 2019-12-26 17:02
-

- 어울림으로 차오르는 따뜻한 공간
- 어린 시절의 겨울을 떠올려보면 추운 날씨에도 바깥 활동을 참 많이도 했다. 팽이치기, 자치기, 썰매타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얼음땡 등 겨울 놀이가 풍성했다.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따뜻한 실내에서도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다. 손주 손 잡고 가족과 함께 즐길 만한 핫 플레이스를 찾아봤다. 1. 힐링과 웰빙을 담는 곳 ‘미리내 힐빙클럽’
- 2019-12-24 09:54
-

- “가수는 꿈에도 없었는데, 운명이란 게 있는 듯해요”
- 1955년생, 베이비붐 세대로서 1978년에 데뷔해 올해로 예순다섯 살. 그러나 이치현의 모습에서 그 세월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 1980년대를 휘어잡던 순간의 ‘이치현과 벗님들’ 리더 이치현이 세월을 뛰어넘어 그대로 내 앞에 있는 것만 같았다. 여전한 젊음과 변치 않은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테크니컬해진 그의 라이브를
- 2019-12-19 10:01
-

- 테마별 실내 5樂 “안에서 놀면 안 춥지!"
- 춥다고 외출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때로 발걸음을 옮겨 즐길 거리 가득한 실내 놀이터를 찾아보자. 찬바람에도 끄떡없는 테마별 실내 5樂 공간을 소개한다. 1樂 문화를 즐기다 ◇ CGV 특별 상영관 국내 최초의 잔디 슬로프 특별관 ‘씨네&포레’는 영화와 숲을 테마로 한 콘셉트로 자연 친화적 스타일로 꾸며졌다. 숲속을 재현한 분위기와
- 2019-12-17 10:56
-

- “텐트 안은 인생과 철학을 품은 우주다”, 캠핑 선구자 박상설
- 그는 자유 해방의 흰색 날개를 몸 어딘가에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하늘로 날아올라 들국화 만발한 넓은 들판을 밝은 눈으로 보게 되리라. 매년 가을 러시아의 거장 톨스토이와 차이콥스키, 도스토예프스키를 한 번쯤은 만나봤을지 모를 기러기들을 보러 철원으로 떠난다는 90대 청년. 캠핑 속에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우주를 품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 2019-11-01 09:19
-

- 임태상 경영 컨설턴트 “윈윈하는 컨설팅으로 일하는 보람 느껴요”
- 대기업에서 30년간 영업관리, 제품개발, 마케팅 등의 업무를 해온 임태상(61) 씨는 퇴직 후 3~4년을 쉬며 제2직업을 모색했다.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하면서도 막연히 ‘뭔가는 하겠지’ 했는데, 그렇게 공백기가 길어지고 말았단다. 사업을 벌이자니 위험부담이 클 것 같았고, 최대한 직장생활의 경험을 살리고 싶었다. 그러던 중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관
- 2019-10-29 10:17
-

- 소도시 완주 삼례읍의 문화예술 공간 만나러 가는 길
- 전주를 감싸고 있는 완주군은 전주보다 존재감이 덜할 뿐 매력이 차고 넘친다. 아마도 완주에 안 가본 이는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이는 없을 듯하다. 완주를 음식에 비유하면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우러나는 ‘곰탕’ 같다고나 할까. ‘어느 날 문득, 무궁화열차를 타고 완주 삼례에 다녀오리라’ 했던 결심을 드디어 실행에 옮겼다. 걷기 코스 삼례역▶
- 2019-10-22 13:39
-

- 행복 전달에 안달이 난 ‘행복 달인’
- 국내외적인 불황 요인들이 겹쳐 수많은 기업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아이디어 제품으로 독자적인 시장을 지키고 있는 회사가 있다. 특허를 획득한 이온생성기가 만들어지는 수전류 시스템을 세계 40개국에 수출하는 아리랑이온이 그곳이다. ㈜아리랑이온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신자 대표는 감사 경영의 대표주자로, 감사의
- 2019-10-17 09:05
-

- 정동식 자문단원, 베트남의 또 다른 코리안 신드롬 ‘NIPA’
- 몇 년 사이 부쩍 가까워진 나라가 있다면 곧장 베트남을 떠올리게 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팀을 아시아 최고 팀으로 환골탈퇴시킨 박항서 감독의 활약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박 감독의 베트남 입성 훨씬 이전부터 ‘브랜드 코리아’를 알리며 실질적인 협력과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힘써온 이들이 있었다. 바로 한국
- 2019-09-03 10:58
브라보 스페셜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2613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