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야에 은둔했으나 창작욕의 화톳불은 활활!
- 예술이 인간을 구원하고 영혼을 인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좀 과한 예찬일지도. 사르트르의 말마따나,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예술은 현실의 벽을 으라차차 걷어차는 행위라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종교, 사상, 철학을 부수거나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지 않던가. 그런데, 창작이란 지병에 시달리는 것처럼
- 2019-11-11 08:41
-

- 꿈을 유예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
- 무슨 일을 하건, 그 분야의 최고가 돼라! 자주 듣는 얘기다. ‘최고’에겐 갈채가 쏟아진다. 다들 ‘최고’가 되기 위해 질주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영혼을 파는 결탁마저 불사한다. 삶의 눈먼 과속은 대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욕망이라는 총구에서 발사된 열정의 탄환. 이 위험한 물질은 과녁을 맞히고도 좌절한다. ‘최고’가 되고서도 감옥에
- 2019-10-07 08: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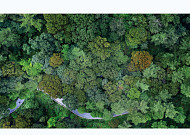
- 간도 크고 통은 더 큰 사람 백범, 그가 머문 숲
- 걷기 쉬운 둘레길이다. 산이 높지 않고 구간 거리도 짧은 편이니까. ‘백범 명상길’ 2코스(3km)를 걸을 경우 한 시간 반이 소요된다. 볼 것 많은 거찰, 마곡사 답사도 즐겁다. ‘정감록’은 마곡사 일대를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십승지의 하나로 꼽았다. 마곡사(麻谷寺) 들머리. 노보살의 허리가 기역자(子)로 휘었다. 향초가 들었을까? 야
- 2019-10-02 09:55
-

- 산에서 찾은, 사람을 살리는 풀
- 지리산 근처 산골이다. 높은 산봉우리들이 사방에 첩첩하다. 그렇지만 궁벽할 게 없다. 좌청룡 우백호로 어우러진 전면의 산세가 빼어나서다. 우람하면서도 부드럽다. 운무 한자락 눈썹처럼 걸려 그윽하다. 한유창(60) 씨가 이곳으로 귀촌한 건 산야초 때문이다. 지리산 권역에 자생하는 야생초에, 그는 깊은 신뢰를 품고 산다. 한때 그는 죽음과 맞닥뜨렸다.
- 2019-09-30 14:07
-

- 황무지를 장엄한 자연 정원으로 바꾼 40년
- 나무를 좋아해 나무와 더불어 한평생을 살았다. 늘 나무를 심었다. 애지중지 가꾸고 돌보고 어루만졌다. 몸뿐인가. 마음까지 나무에게 바쳤다. 그 결과 들판 가운데에 있던 황무지가 장엄한 숲으로 변했다. 거대한 정원이 태어났다. 들어보셨는가.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죽설헌(竹雪軒)이다. 사건의 주인공은 한국화가 박태후(64). 사건? 그렇다,
- 2019-09-09 08:57
-

- 귀농으로 몸 건지고 정신 닦고
- 그는 망가진 몸을 고치기 위해 귀농했다. 죽을 길에서 벗어나 살길을 찾기 위해 산골에 들어왔다. 그 외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결과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리 맞은 호박잎처럼 시들어가던 그의 구슬픈 신체가 완연히 회생했으니. 산골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아름답고 기묘한 지구별과 이미 작별했을 거란다. 현명한 귀농이었다는
- 2019-09-06 11:11
-

- 꽃빛 번져 천지가 붉다
- 병산서원 앞 병산 아래로 낙동강이 굽이친다. 서원 답사 뒤에는 강변 산책을 즐겨볼 만하다. 인근 부용대 쪽엔 서애 유성룡이 ‘징비록’을 집필한 옥연정사가 있다. 병산서원을 기점으로 하는 둘레길인 ‘선비길’도 운치 있다. 한 시간쯤 걸으면 하회마을에 닿는다. 꽃다운 시절은 저물었어도, 꽃 하나쯤 마음에 두는 맛까지 포기할 수 없다
- 2019-08-30 09:12
-

- 앎을 내려놓아라! 이놈들아, 앎이 곧 장애이니라!
- 쌀가마니를 공깃돌처럼 다루고, 바윗덩이로 공차기를 했다는 기인. 축지법과 경공법으로 허공을 날다시피 한 무림 고수. 탄허 스님이 삼배(三拜)를 올렸다는 도인. 원혜상인이라고, 전설적 고수의 이름을 들어보셨는가? 162세 장생을 누렸다는 그의 기적이 믿어지는가? 뻥이라고? 증인이 있었다. 원혜상인의 수제자 박대양(2017년 작고). 그는 타오르는
- 2019-08-12 08:39
-

- 나여! 나부터 잘해보더라고!
- 귀촌을 위해 집을 샀으나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다. 남의 토지 위에 들어앉은 건물만 샀으니까. 건물 값은 900만 원. 토지 사용료는 연세(年貰)로 치른다. 폐가에 가까운 건물이었다지. ‘까짓것, 고쳐 쓰면 그만이지!’ 그런 작심으로 덤벼들었다. 뭐든 뚝딱뚝딱 고치고 바꾸고 꾸미는 재주가 있는 그는, 단지 두 달여 만에 쓸 만한 집을 만들어냈다.
- 2019-08-05 08:51
-

- 바위도 버들치도 이곳에선 신선이다
-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선유동천 나들길’의 총 연장은 8.4km. 선유동촌을 중심으로 한 구간이 1코스(4km), 용추계곡 일원은 2코스(4.4km)다. 백미 구간은 선유구곡이며, 용추계곡의 용추폭포도 하트(♥) 모양의 소(沼)로 유명하다. 구간마다 차량 접근도 쉬운 편이다. 산만큼 완벽한 미학과 안정감을 구현한 건축이 다시 있을까.
- 2019-08-01 08:44
브라보 추천뉴스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