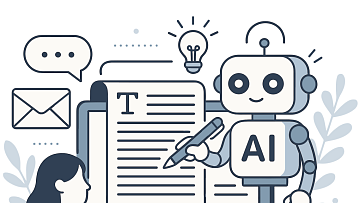-
![[박영민의 웰빙골프] 바른 자세는 올바른 호흡에서](https://img.etoday.co.kr/crop/190/135/716218.jpg)
- [박영민의 웰빙골프] 바른 자세는 올바른 호흡에서
- 골프 수준은 스코어로 말한다. 유연하고 반복할 수 있는 스윙으로 일관(Consistent)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며 자신감(Confidence)을 높여주는 샷을 구사할 수 있으면 스코어가 낮아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클럽을 휘두르는 동작은 스윙, 표적을 향한 거리와 방향을 고려해서 공을 때리면 샷으로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면 스코어(Score) = 스윙(Swing) + 샷(Shot) 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하지만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50대 이후 시니어들에게 단순한 이 공식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노화 진행이 점점
- 양용비 기자 2015-09-26
-
![[임성빈의 문화공감] 루이 암스트롱과 엘비스 프레슬리](https://img.etoday.co.kr/crop/190/135/703408.jpg)
- [임성빈의 문화공감] 루이 암스트롱과 엘비스 프레슬리
- 음악을 좋아하게 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그때그때 새로 유행하는 음악들을 주로 들었다. 그러나 음악실에 자주 다니고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 그 전에도 좋은 음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의 가수나 연주자 중 가장 오래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영화이야기에서 소개한 ‘사랑의 종이 울릴 때’에도 출연했던 루이 암스트롱일 것이다. 그는 1920년대의 St. Louis Blues부터 1930년대 Stardust, When The Saints Go Marchin’ In, 1940년대 High Society, Blue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자 2015-09-26
-
![[추천영화] 본처와 후처 46년의 아름다운 동행<춘희막이>의 한경수 프로듀서 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190/135/703456.jpg)
- [추천영화] 본처와 후처 46년의 아름다운 동행<춘희막이>의 한경수 프로듀서 인터뷰
- 홍역과 태풍으로 두 아들을 잃은 큰댁 최막이는 대를 잇기 위해 작은댁 김춘희를 집안에 들이게 된다. 본처와 후처, 이보다 더 얄궂은 인연이 또 있을까?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마지막을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가 된 두 사람. 영화 는 모녀처럼 자매처럼 때론 친구처럼 지내온 두 할머니의 아름다운 동행을 그린 영화다. 이지혜 기자 jyelee@etoday.co.kr 가 영화로 탄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 제작 과정의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영화를 연출한 박혁지 감독은 200
- 이지혜 기자 2015-09-21
-
![[추천도서] 허구라는 장치로 진실을 알리는 작가 <글자전쟁>의 저자 김진명 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190/135/703441.jpg)
- [추천도서] 허구라는 장치로 진실을 알리는 작가 <글자전쟁>의 저자 김진명 인터뷰
- 천년 제국 고구려를 되살리고 있는 작가 김진명의 ‘필생의 역작’인 대하소설 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충돌의 그림자에 드리운 한반도의 운명을 그린 에 이은 2015년 또 하나의 대작 . 베스트셀러 상위 순위에서 한국 소설이 사라져가는 요즘, 나오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해온 그의 이번 작품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침체된 한국 문단의 현실 속에서 빛을 내고 있는 작가 김진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지혜 기자 jyelee@etoay.co.kr 을 쓰게 된 계기와 이 책을
- 이지혜 기자 2015-09-17
-
![[함철훈의 사진 이야기] 꽃을 오래 본다는 것은 우주를 가까이 본다는 것](https://img.etoday.co.kr/crop/190/135/703369.jpg)
- [함철훈의 사진 이야기] 꽃을 오래 본다는 것은 우주를 가까이 본다는 것
- 하늘에 별과 달이 있다면, 땅에는 풀과 꽃이 있다. 몽골의 여름 초원에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뜻을 온몸으로 기억할 것이다. 계절이 봄을 지나 가을이 시작되기 전의 여름이라야 한다. 세상 꽃의 원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즈음 거기에 다녀온 내 친구는 “목 놓아 울기 좋은 곳”이라고 했다. 나는 여기서 많은 꽃을 만났다. 늦은 나이에 무슨 꽃 타령! 그래도 좋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 내게 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꽃은 하늘의 구름, 우리의 달 항아리처럼 사내를 철들게 하는 창조주의 세심한 장치임에 틀림없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자 2015-09-11
-
![[물건의 사회사] 낡은 듯 익은 듯 품격을 더하는 만년필](https://img.etoday.co.kr/crop/190/135/704916.jpg)
- [물건의 사회사] 낡은 듯 익은 듯 품격을 더하는 만년필
- 글. 박종진 만년필동호회장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대한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완성된다는 뜻이다. 만년필도 이와 같다. 1800년대 후반 실용적인 만년필이 만들어졌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고 편리한 것은 추가돼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것은 재미있게도 발전하고 다듬어지는 우리의 인생(人生)과 비슷하다. 유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발전기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청년기인 황금기가 있다. 그리고 황금기를 지나면서 만년필은 완성됐다.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자 2015-09-07
-
![[추천공연] 연극 <나는 형제다>의 김광보 연출 겸 서울시극단 단장 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190/135/703447.jpg)
- [추천공연] 연극 <나는 형제다>의 김광보 연출 겸 서울시극단 단장 인터뷰
- 김광보·고연옥 콤비의 4년만의 신작 . 2013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 테러사건을 모티브로 한 고연옥 작가의 희곡으로 서울시극단 김광보 신임 단장이 직접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온 두 형제의 성장과 실패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리고 있다. 이지혜 기자 jyelee@etoday.co.kr 서울시극단 단장 취임 후 첫 작품이라 심사숙고했을 텐데, 를 택한 이유는? 고연옥 작가와는 인연이 깊죠.
- 이지혜 기자 2015-09-07
-
![[김인철의 야생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의 여름을 물들이는 분홍바늘꽃](https://img.etoday.co.kr/crop/190/135/703375.jpg)
- [김인철의 야생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의 여름을 물들이는 분홍바늘꽃
- ‘한반도 북방계 식물의 뿌리를 찾아본다’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외교부와 코레일이 공동 주관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에 참여한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 다시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2612km, 총 1만1900km의 거리를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19박 20일간의 대장정에 나서며 우선은 차창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시베리아 숲으로 들어가 식생을 관찰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온 탓에 한나절 이상의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자 2015-09-07
-
![[이태인의 포토아이] 새벽 산책](https://img.etoday.co.kr/crop/190/135/662323.jpg)
- [이태인의 포토아이] 새벽 산책
- 무더위를 피해 내륙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 시흥의 내만 갯골에 가보았습니다. 이곳은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던 염전이었습니다. 이제 찾는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진 곳에서 새벽을 깨우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과 안개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새벽 산책은 어떠신가요?
- 이태인 기자 2015-09-07
-
![[김인철의 야생화] 한국의 야생화를 대표하는 특산식물 '금강초롱꽃'](https://img.etoday.co.kr/crop/190/135/682894.jpg)
- [김인철의 야생화] 한국의 야생화를 대표하는 특산식물 '금강초롱꽃'
- 굳이 전문가나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우리 야생화, 이름을 들어봤기에 많은 이들이 직접 만나보기를 원하는 우리 야생화를 꼽는다면 아마 금강초롱꽃이 가장 앞 순위에 들 것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기에 가장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식물학적으로 희귀하기에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의 하나가 바로 금강초롱꽃입니다. 꽃의 크기나 모양, 색 등 미학적으로도 전 세계 어느 야생화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자 2015-08-24
-
![[추천 공연] 기구한 삶 속 애달픈 사랑 이야기, 연극 <홍도>의 주인공 배우 양영미 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190/135/682047.jpg)
- [추천 공연] 기구한 삶 속 애달픈 사랑 이야기, 연극 <홍도>의 주인공 배우 양영미 인터뷰
- 지난해 연극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으며 극공작소 마방진의 신파극 레퍼토리 중 대표작으로 자리 잡은 연극 가 돌아왔다. 화류비련극 는 1930년대 젊은이들의 사랑과 삶의 모습을 다룬 신파극 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기생 홍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의리와 순정을 지켜내는 홍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지난해 연극 를 통해 2014 동아연극상 여자 연기상을 받은 배우 양영미를 비롯해 배우 예지원 등 초연에 참여했던 배우들이
- 이지혜 기자 2015-08-19
-
![[하태형의 한문산책] 중국과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들](https://img.etoday.co.kr/crop/190/135/682926.jpg)
- [하태형의 한문산책] 중국과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들
- 중국에서 사용되는 사자성어 중 우리와 뜻을 달리하는 것들이 꽤 많다. 정확히는 우리나라로 들어와 뜻이 변질된 것들이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단어가 있다. 원전은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篇)으로,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께 물었다. “사(師:자장(子張))와 상(商:자하(子夏)) 중 어느 쪽이 어집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 “그럼 사가 낫단 말씀입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과유불급인데, 어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자 2015-08-19
-
![[임성빈의 문화공감] 삶꾼 무애의 이야기](https://img.etoday.co.kr/crop/190/135/682908.jpg)
- [임성빈의 문화공감] 삶꾼 무애의 이야기
- 언제부터인가 필자에게 음악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필자의 집에는 영국의 B사 제품인 Wave 라디오가 2대 있다. 이 라디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2001년 초 청계산 추모공원 관련 자료 수집 및 시찰로 미국 LA에 갔을 때 이 라디오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틀어보니 과연 B사가 자랑하던 대로 소리가 전 공간에 울려 퍼지는 것같이 듣기가 매우 좋아 한 대를 구입하여 집에서 듣게 되었다. 그 후 같은 라디오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자 2015-08-11
-
![[이태인의 포토아이] 은하수](https://img.etoday.co.kr/crop/190/135/689747.jpg)
- [이태인의 포토아이] 은하수
- 하늘과 별과 바람 여름은 은하수입니다. 떠오르는 은하수를 보노라면 누구든지 할 말을 잃고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은하수를 감상하기 괜찮은 곳은 강원도 지역이랍니다.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답니다. 음력으로 며칠인지 따져보고 보름 언저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별 보기를 방해하는 것은 달이기 때문이죠. 은하수를 모르고 자란 손주 녀석 손잡고 ‘별맛’을 보러 가보죠. 가슴에 별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풍요로움이 삶을 진지하게 만들잖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찾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 이태인 기자 2015-08-11
-
![[함철훈의 사진 이야기] 윤슬을 보았습니까](https://img.etoday.co.kr/crop/190/135/682915.jpg)
- [함철훈의 사진 이야기] 윤슬을 보았습니까
- 윤슬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햇빛이나 달빛이 일렁이는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구슬처럼 보여 ‘빛구슬’이라고 하는데, ‘물비늘’이라는 비슷한 어감의 말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 영롱한 윤슬을 사진기에 담아내기 위해 호수가로 나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뷰 파인더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피사체와 정작 필름에 담기는 내용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사진가는 그 두 이미지 사이의 간극에 오락가락하며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좌절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기대 이상의 결과에 스스로 놀라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자 2015-08-11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