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천에서 들러 볼 만한 아름다운 숲, 나남수목원
- 숲에 들면 차분해진다. 그리고 푸근하다. 나무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은혜롭다. 더 바랄 것 없이 관대해지기까지 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밀린 숙제 하듯 허둥대며 떠밀려온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느긋하고 풍요해지는 마음이다. 걷기만 해도 지지고 볶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듯하다. 차분해지고 감사함이 생겨난다. 숲이 주는 고마움, 풍성하게 누린 날이다.
- 2021-12-02 09:39
-

- "마스크 착용해 눈 건조?" 안구건조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안구건조증은 눈물 분비의 부족과 눈물 증발 등의 전통적 병인과 안구 표면의 염증, 눈물층 불균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복합적 질환이다. 인공누액 이외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2007년 안구 표면의 염증을 억제하고 눈물 분비를 증가시키는 치료제가 승인되면서 현재는 어느 안과를 방문하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 2021-11-30 15:27
-

- 인생 2막, 꿈이 열어준 철 공예 장인의 삶
- 인사동 골목의 널찍한 지하 1층 공간에 칼, 창, 도끼, 철퇴, 심지어 주사위까지, 철로 만든 다양한 것들이 전시돼 있다.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등 동양 도검부터 중세 유럽 배경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창과 칼도 있다. ‘한국의 마지막 칼 장인’, ‘도검 전문가’ 등으로 불리는 한정욱(69) 씨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칼 전시장 ‘나이프 갤러리’의 모습
- 2021-11-25 08:58
-

- 화순 임대정 원림, "세 겹 물 정원 꾸린 까닭"
- “지구는 외계 행성의 지옥일지도 모른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훈수가 이렇다. 지지고 볶는 경쟁과 빙하처럼 차가운 인간관계로 굴러가는 현실 세계의 단면을 은유한 얘기다. 그러나 여기가 지옥이기만 할까. 마음에 난초 하나만 들여놓아도 흐뭇한 법이다. 구겨진 인생일망정 자연을 벗 삼으면 유토피아가 가깝다. 조선 선비들은
- 2021-11-19 08:18
-

- "미술로 시대 그늘 읽어" 양정무 한예종 교수
- ‘미술 대중화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양정무(55) 교수는 서양미술사 연구자인 동시에 친절한 미술 안내자로서 출판과 강연, 방송 등을 통해 대중과 미술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신간 ‘벌거벗은 미술관’을 통해서 서양미술사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를 만나 미술의 가치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신간이 나올 때까지 8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이 책은 비평
- 2021-11-18 07:42
-

- "고인의 빈자리 채우는 것이 우리 일”
- 인터뷰를 위해 다시 만난 것은 3년 만의 일이었다. 처음 김석중(52) 키퍼스코리아 대표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소개됐을 때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다. 길게 길러 뒤로 묶은 머리와 유품정리 과정에서 허락을 받아 쓰고 있던 작은 캐리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모험을 떠나는 여행가 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국내의 대표적인 유품정리사로 손
- 2021-11-16 09:09
-

- 시니어 익숙한 명사 다큐 영화가 뜬다
- 요즘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니어,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밀접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족적은 우리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일 것. 이에 해당하는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근 개봉작을 살펴봤다. 왕십리 김종분 감
- 2021-11-15 18:40
-

-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해져” 입법 예고
-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 법무부는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독신주의자인 80세의 A 씨는 지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어, 알고 지내던 청년 B 씨의 간병을 받았다. 극진히 간병해준 B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A 씨는 그를 친양자로 삼고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 2021-11-12 17:27
-

- KTX 강릉선 타고 가을 여행, 가 볼 만한 곳은?
- 가을이라 해도 날씨는 여전히 온화하다. 강릉으로 떠나며 날씨를 검색해보았더니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는 예보다. 환절기의 쌀쌀함을 즐길 때는 아닌 것 같아 머플러랑 니트를 주섬주섬 더 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릉은 언제나 따스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곳은 언제나 따스하게 날 맞는다. 아마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은 강릉. 명주동
- 2021-11-12 08: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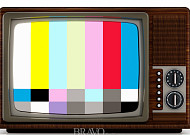
- 디지털 홍수 속, ‘아날로그 맨’도 편리해야 한다
- 넷플릭스를 둘러보다가 오랜만에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봤다. 작품에서 화 한 번 내지 않을 것 같은 털털한 인상의 주인공 정원은 극 중 두 번 화를 낸다. 이 가운데 두 번째 화를 내는 장면에서 정원은 어떻게 비디오를 틀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에게 화를 낸다. 자신의 죽음에 대비해 아버지에게 비디오 재생 방법을 반복하여 알려주
- 2021-11-10 08:24
브라보 스페셜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2613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