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자 1명 정년 연장되면, 청년 고용 0.2명 감소
- 정년 연장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 고용이 0.2명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근무하는 민간기업의 고용 자료를 분석했다.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 2020-05-15 09:00
-

- 한국의 기념일 '로즈데이'… 장미 색상별 꽃말은?
- 연인끼리 사랑의 표현으로 장미꽃을 주고받는 5월 14일 ‘로즈데이’를 맞아 색상별 꽃말과 기념일이 된 유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먼저 빨간 장미의 꽃말은 ‘불타는 사랑, 아름다움, 사랑의 비밀, 열정적인 사랑’이며, 주황색 장미는 ‘첫사랑, 수줍음’을 뜻한다. 분홍색 장미의 꽃말은 ‘행복한 사랑, 사랑의 맹세’, 흰색 장미는 ‘순결, 존경’, 보라색
- 2020-05-14 10:48
-

-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 조성… 시니어부문 신속 추친
-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노년층 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60여만 개의 일자리의 경우 비대면, 야외작업으로 돌려 최대한 신속하게 전환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나타나는 고용위기 상황과 관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 2020-05-14 09:36
-

- 4월 취업자 47만6000명↓… 1999년 2월 이래 최악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29세
- 2020-05-13 10:47
-

- ‘에누리’를 알려준 석싱 씨
-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지게 목발 두드리며 노래 부르고 다니던 1960년대 공주 시골의 청년들 중에 석싱이라는 이가 있었다. 이름이 김석성인데, 어른들은 대충 석싱이라고 불렀다. 기남이도 기냄이라고 부르는 게 충청도 사람들인데 뭐. 내 또래인 석싱이의 동생은 석윤이었지만 서균이가 아니라 성뉸이라고 불렀다. 나보다 8~9세 많은 석싱 씨
- 2020-05-13 09:18
-

- “가아련다 떠나려언다”
-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아이들은 호모 루덴스(유희하는 인간)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논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하고 카톡을 하면서 주로 비대면으로 혼자 논다. 하지만 1960년대의 아이들은 또래들과 만나서 놀고, 동물들과 놀고, 말장난 수수께끼에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며 놀았다. 장난감이 없던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말이 장난감이었다.
- 2020-05-06 09:04
-

- "라이벌이 된 우정"
- 시대를 앞서간 명사들의 삶과 명작 속에는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사유와 실천이 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유와 사랑과 우정 이야기가 있다. 그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본다. 이번 호에는 질투로 얼룩졌던 마티스와 피카소의 우정을 소개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젊은 예술가들의 산실로 불리던 파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보헤미안들
- 2020-05-02 08:00
-

- 금융소비자를 위한 피해예방 교육 강화된다
-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된다.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라임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는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손실과 청소년 및
- 2020-05-01 09:54
-

- 오욕 딛고 일어선 거장 '비제이 싱'
- 오욕(汚辱)을 뒤집어쓰면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외길 인생을 걷다가 앞길이 창창한 젊은 나이에 그랬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오늘은 그런 오욕을 딛고 일어서 마침내 거장이 된 사람 얘기를 해보려 한다. 누구 얘기냐고? 자주 그랬듯이 문제 나간다. 미국 프로골프투어(PGA투어)에서 역대 누적 상금이 가장 많은 선수는 누구일까? 에이, 너무
- 2020-05-01 08: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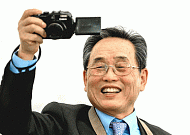
- “있으나 마나 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
- 디지털 실버,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자주 귀에 들려오는 요즘이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들의 삶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내가 청파 윤도균 님을 만난 건 순수문학 수필작가회에서다. 팔순을 코앞에 둔 나이에 아직도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인천 N방송 시민기자로도 활동한다.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걸까. 그 열
- 2020-04-30 08:00
브라보 스페셜



![[Trend&Bravo] 6070세대가 말한 노후 최대 걱정거리 5](https://img.etoday.co.kr/crop/85/60/2282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