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지난주에 ‘물서가 진란한 말장난’을 썼더니 재미있다고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 나 스스로 놀랐다. 원래 인간은 유희본능이 있는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여서 그런 글이 먹히는가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데다 어디 나다니기도 겁나니 즐거운 걸 자꾸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싶다.
어떤 분이 글을 읽고 “절망 댄다하닙다!”라고 카톡을 보내왔기에 “내가 염오시켰나보다” 했더니 “전느 직잔 옴여되고 탁라한 삼라이닙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스타시군요”라고 응수했다.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애들같이 주고받다가 이왕 말장난을 시작한 거 이번엔 받침을 뺀 이름 이야기나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친구 임철수와 나는 니은 하나 차이이지만, 받침을 빼면 지나 내나 똑같이 이처수가 된다. 사람 이름에서 받침을 빼는 이유는 놀려먹기 위해서다. 짝사랑 상대가 도대체 내 맘을 몰라준다면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가 없어 트월킹(twerking)으로 털어내는 걸 상상하면 좋다고 한다. 트월킹은 자세를 낮추고 상체를 숙인 채 엉덩이를 빠르게 흔들며 추는 춤이다. 받침 빼버리기는 이름에 대한 트월킹 같은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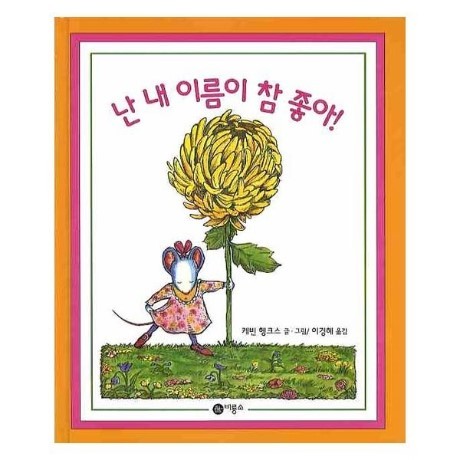
그렇게 받침을 빼고 보니 김대중은 기대주, 문재인은 무재이, 이재명은 이재며, 반기문은 바기무, 윤석열은 유서여, 조국은 조구, 정경심은 저겨시, 강경화는 가겨화, 윤미향은 유미햐, 손혜원은 소혜워, 최강욱은 최가우, 김어준은 기어주, 노영민은 노여미, 이성윤은 이서유 이렇게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차가 지고 이나여가 올라왔다. 그런데 와, 추미애는 역시 세다. 빼버릴 받침이 없어 온전하게 그냥 추미애다. 과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름이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그동안 받침 없는 삶이 얼마나 모질고 힘들고 억지였을까?
이렇게 받침을 빼고 사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건 47년 전인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에서 교생실습을 해야 할 때 나는 이천북중에 가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가르쳤다. 중학교엔 독일어 과목이 없으니까 그랬던 건데, 지방 실습은 유신시대의 말도 안 되는 제도였다.
하여간 그 학교에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 평화봉사단원 한 명이 있었다. 성이 Knapp인 그 젊은이를 교사들은 납도 아니고 냅도 아니고 크납도 아닌, 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받침을 빼고 편하게 부르려고 성을 나 씨로 지어준 것이었다.
그 나 선생이 내 지도교사(그도 독어과 출신 영어교사였다)와 이야기하면서 날 평하기를 “very sour”라고 했다고 한다. 처음엔 신랄하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맛이 간 녀석’이라는 뜻이었던 거 같다. 거 왜 있잖은가? 음식이 상했다는 산패(酸敗)라는 말. 그러니까 지도교사랑 둘이서 나를 흉보고 안주 삼아 씹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한국인 중에는 ‘바서오 선생님’이 있었다. 무슨 과목이었는지 잊었는데, 키 작고 머리가 약간 벗겨진 바서오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사람 좋고 귀엽고 약간 어수룩하고 모자란 듯도 해 놀려먹기 좋았다. 그래서 교사들이 박성온이라는 이름에서 받침을 이 뽑듯이 다 빼버리고 바서오로 개명을 해준 것이었다. 알고 보니 대학 선배였던 바서오 선생은 역시 대학 선배인 교장과 함께 우리 교생 일동 5명(?)에게 거하게 저녁을 사준 적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짓궂은 내가 그날 술자리에서 바서오라고 부르며 놀려먹은 기억이 난다.
바서오 선생님을 안 뒤부터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에서 받침을 빼보는 습관이 생겼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었던 건 아니고 이름이 좀 특이하거나 별나다 싶으면 그랬다. 이천북중 당시 내 지도교사는 오늘날 미국에서 저명한 영화평론가로 활동 중인 박흥진 씨인데(나는 걸핏하면 바킁진이라고 쓴다), 받침을 빼니 바흐지가 됐다. 근데 이게 뭐야? 바가지도 아니고. 바흐친이라면 몰라도 좀 재미가 없었다.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바흐친(1895~1975, 러시아의 사상가, 문학 이론가)
여러 사람의 받침을 빼 봐도 바서오만큼 재미있고 말맛이 좋은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좀 재미가 있다 싶은 이름은 다음과 같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글 읽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누군지 다 알 것이다. 기조피[血?], 소재피[血?], 이혀[舌?]규, 소우혀[舌?], 하태혀[舌?], 유태혀[舌?], 바과수, 바사도, 바서수, 바재우, 바저사, 바조지, 야조서, 이조거, 채여보….

이 글을 쓰면서 겨우 안 건데, 받침을 뺄 때는 박이나 반, 방 씨 성 가진 분들의 이름이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다는 점이다. 이런 발견을 하게 만들어준 바서오 선생님은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계실까. 정확히 모르지만 나이가 팔순을 좀 넘었지 싶은데, 혹시 이름이 성온(性溫)이라면 글자 그대로 따뜻한 성품으로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 잘 화목하게 지낼 것 같다.
이름은 남의 놀림감이 될 수는 있으나 젊어서든 늙어서든 변함없이 소중한 것이니 저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름을 닮아간다는 말도 들었다. 전혀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렇다고 주장하면 정말 참 거시기한 일이긴 하지만.


![[요즘말 사전] “디토합니다” 뜻, 알고 보니 추억의 단어였다](https://img.etoday.co.kr/crop/190/120/2299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