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사랑도 와인처럼 시간이 필요해
- 가끔 내리는 비가 성급하게 여름으로 치달으려는 대지를 달래주는 덕에 봄 날씨가 겨우 연명하고 있다. 화사한 꽃이 만발한 따뜻한 봄날에 걸맞은 싱그러운 영화 한 편이 도착했다. 프랑스 영화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이다. 원제는 ‘Back to Burgundy’로 그저 와인의 명산지인 부르고뉴로 돌아왔다는 말인데 영화 수입사가 설명적인 제목을 덧붙
- 2018-05-21 15:52
-

- 일도 사랑도 모두 잡은 스포츠 부부
- 이들을 회사원으로 따지자면… 사내 커플…? 동료에서 애인으로, 애인에서 부부로! 같은 일을 하기에 더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들. 함께 땀 흘리며 사랑을 키워온 스포츠 선수 부부를 알아봤다. 원정식 ♥ 윤진희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 역도 53kg급에서 값진 은메달의 성적을 거둔 윤진희(33) 선수. 시상대에서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보는
- 2018-05-14 11:11
-

- 2018 제13회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 5월 5일 저녁 7시 삼성역 코엑스 D홀에서 2018 제13회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열렸다. 각종 미디어 업체의 촬영 팀들과 패션 업체의 관계자들, 일반 관객들로 인해 행사장은 열기로 넘쳤다. '문명의 꽃' 최첨단 디지털 세상에서는 무대를 꾸미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재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컴퓨터만 있으면 해결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처리한
- 2018-05-14 11: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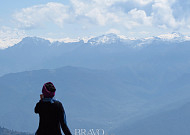
- ‘부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비밀을 찾아서
- 지구상에서 세계화와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고유의 전통을 지키는 곳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오직 한 나라,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희귀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부탄이다. 전 세계가 GNP(국민총생산)만을 부르짖으며, 효율과 편리라는 기치 아래 경제성장에 목을 맬 때도, GNH(국민총행복지수)를 최고 정책으로 삼고 있는 나라.
- 2018-05-09 11:13
-

- “연기는 남은 인생의 숙명” 배우 양미경
- 여행, 사진, 시낭송… 프로급 취미로 쌓은 내공 배우 양미경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인덕대학교로 갔다. 배우이자 교수인 그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양이었다. 몇 번의 약속시간과 장소를 조정해가며 어렵게 만났다. 게다가 그녀는 인터뷰를 싫어해서 8년 만에 처음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이봉규로서는 행운을 잡은 것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 2018-05-04 08:54
-

- 똑같은 맥주가 싫다면 맥주공방으로
- 수제 맥주(Craft Beer)가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수제 맥주를 파는 음식점이 늘어나더니 직접 만들 수 있는 공방까지 생겨났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인 수제 맥주! 강신영(65), 김종억(64) 동년기자가 맥주공방 ‘아이홉’에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봤다. 촬영 협조 아이홉 1. 물에 맥아추출물 넣고 끓이기 맥주를 만들기에 앞서 강신영, 김
- 2018-04-12 18:16
-
- 역사·문화와 만나는 길
- 요즘은 ‘둘레길 걷기’가 대세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 근처에서 산책하고, 둘레길 걷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 걷기 왕초보인 필자가 걸어보니 건강을 지키는 데 알맞은 거리와 시간은 10km 안팎의 3시간 정도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 걷는다 해도 무작정 걷기만 하는 곳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걸으면서 역사나 문화를 접할 수
- 2018-04-06 14: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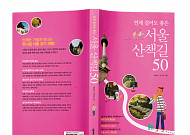
- 언제 걸어도 좋은 ‘서울 산책길 50’
- 북촌 8경길, 여의도생태순환길, 서리풀공원길 등 서울 시내에 산책 삼아, 운동 삼아 걷기 좋은 길들이 많아졌다. 그중 어디를 걸어도 좋지만, 원하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코스라면 더욱 환영이다. 서울 곳곳 50가지 걷기 코스의 지도, 소요 시간, 여행 정보 등을 비롯해 길의 역사와 문화 정보까지 알차게 담은 ‘서울 산책길 50’을 책방에서 만
- 2018-04-03 11:43
-

- 주막에서 마무리하는 정겨운 시골길 걷기
- 요즘은 훌쩍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 걷기 좋은 길이 있는지 먼저 살핀다. 멋진 풍광과 맛난 먹거리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걸으면서 힐링이 되는 여행지를 너도나도 챙기는 추세다. 흐르는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 속에 파묻혀볼 수 있는 걷기 좋은 길이 있다. 육지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섬마을 경북 예천의 회룡포(回龍浦) 길은
- 2018-04-03 11:42
-

- 인생 프로 ‘재미’와 ‘의미’로 뭉쳐 만나다 ‘미미클럽’
- 이들이 모인 지는 딱 1년. 봄바람 불던 2017년 3월 어느 날. SNS로 ‘외롭다, 외롭다’를 외치다 처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다. 1년도 안 돼 기막힌(?) 사고를 쳤다. 또 어떤 일을 벌여볼까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매달 얼굴을 마주한다. 아! 그 이름도 곱디곱다. 이름하야 ‘미미클럽’! 이름 때문에 예쁜 언니 모임인 줄 알았더니 중년 신사의 웃음소리
- 2018-03-22 09:40
브라보 스페셜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2613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