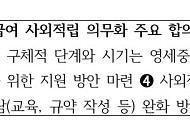일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입‧지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 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 비현금 결제를 이용했으며, 70%는 금융자산(부동산 제외) 보유액이 ‘1000만 엔(약 9411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최대 시니어 커뮤니티 취미인클럽(趣味人倶楽部)의 운영사인 오스탄스(オースタンス)社는 지난 12일 회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9월 9일부터 2일간 온라인 설문으로 7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약 70%가 60대 이상이며, 38%가 가구 연소득 500만 엔(약 4711만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생활비를 뺀 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3명 중 1명이 5만 엔(약 47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거주 환경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를 “이미 다 갚았다”가 72.2%로, 주거비 부담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월 생활비(주거비 제외·취미·여행 포함)는 ‘5만~15만 엔 미만’(약 47만~141만 원) 구간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불 방식에 대한 조사에선 일본인들은 현금사용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선입견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최근 한 달 내 비현금 결제 이용자는 89.9%였다. 일상적으로 쓰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88.4%로 현금 85.4%를 앞섰다. 간편 결제 이용률은 56.5%이었다.
최근 1년 내 구매·이용 항목은 외식이 80.2%로 최다였고, 의류·패션소품 62.2%, 취미·여가·학습 62.1%, 여행·관광 56.1%, 금융·보험 서비스 39.4%가 뒤를 이었다. 금융자산이 높을수록 금융·보험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았는데, 자산이 3000만 엔(약 2억8233만 원)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부터 절반 이상의 이용 비율이 나타났다.
이용 금융·보험 상품은 보통·정기예금 94.3%, 생명보험 74.0%, 손해보험 63.5%가 중심이며, 투자신탁 58.1%, 주식 61.1%도 과반을 넘었다. 이용 목적은 ‘노후·장래 생활자금 준비’ 79.7%, ‘질병·상해 대비’ 64.5%, ‘자산운용·형성’ 53.0%, ‘자녀·손자에게 자산을 남기기’ 20.3% 순이었다. 현재 운용 중인 투자금 총액은 ‘500만 엔 이상’(약 4705만 원)이 50.0%로 가장 많았다.
가장 고액이었던 지출에서 100만 엔 이상(약 941만 원)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자동차’ 73.5%, ‘투자·자산형성’ 72.6%, ‘부동산‧집수리’ 70.4%였고, 500만 엔 이상(약 4705만 원) 지출에서도 같은 세 분야가 두드러졌다. 고령자 대상의 조사결과이지만 지출 중 투자‧자산형성에 대한 비율이 높은 부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종 소비재 구매의 경우 온라인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영양제는 온라인 쇼핑이 51.4%로 약국(34.9%)을 앞섰고, 주로 ‘본인’을 위해서(98.9%) 샀다. 구매 빈도는 ‘월 1회’가 41.2%로 최다였다. 의류를 구매할 때도 온라인 비중이 적지 않았다. 구매처는 전문점 66.2%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 45.3%, 백화점 36.8% 순이었다. 구매 빈도는 ‘3개월에 1회’가 36.5%로 가장 많고, 월 지출은 5000~1만 엔 미만(약 5만~9만 원)이 29.1%로 최다였다. 가구·가전은 가전양판점 77.0%, 온라인 51.8% 등이 주요 채널이었으며, 구매 주기는 ‘2~3년에 1회’가 27.5%로 가장 길게 형성됐다.
여행·관광은 동행자로 ‘배우자·파트너’가 66.8%로 최다였고, 빈도는 ‘3개월에 1회’ 35.3%, ‘반년에 1회’ 26.1% 순으로 계절 단위 여행 패턴이 확인됐다. 여행 형태는 ‘국내 숙박여행’이 86.3%로 중심이었다.
취미인클럽 회원들은 개인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니어 세대로 이번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일본 내 고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고령자세대의 평균소득은 약314만 엔(약 2949만 원)이다. 반면에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25.4%만이 본인 세대의 연소득 300만 엔 미만이라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오스탄스 측은 “본 조사는 특정 커뮤니티 회원 기반 패널 조사로 전체 고령층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