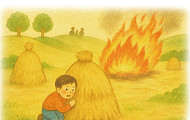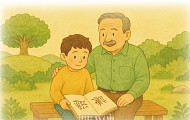효(孝)는 번거로운 의무가 아니다.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상의 배려, 그 조용한 안부가 곧 효의 본질이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첫날, 누나 집에서 자고 왔다. 장남인 내게 그 누나는 친누나가 아닌 ‘엑스 누나’였다. 왜 엑스(X) 누나라 불렀는지는 모른다. 그때는 여중생들이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동생’으로 삼는 게 유행이었다. 나를 동생으로 삼은 누나는 둘이었다. 제천여중 3학년으로, 태백선 기차를 타고 통학하던 쌍용리 사는 두 누나였다. 통학 기차에 매일 늦게 올라타는 나를 챙겨준 인연이 이어져 둘은 나를 동생 삼았다. 결연은 간단했다. 그중 키 큰 누나가 “얘 동생 삼자”고 했고, 바로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다. 당연히 나는 엑스 누나라 하지 않고 그냥 누나라 부르고 따랐다.
아침마다 함께 기차를 타고 학교로 가고, 하굣길에도 역까지 동행했다. 먹을 것도 사주고, 모든 걸 챙겨줬다. 내가 먼저 방학식을 끝내고, 여중 앞에서 기다렸다가 셋이 자장면을 먹었다. 기차 타고 가는 중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을 꺼내 누나 집에 가기로 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무렵이었다. 개천에 물이 불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비는 밤새 내렸다.
다음 날 누나들이 나를 데리고 집에 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프지 않게 나를 마구 때렸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가슴팍을 찔렀다. 뒤로 넘어진 나를 누나들이 일으켜 세우며 변호하자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입이 없냐?”라는 호통이 이어졌다. 말씀 끝에 아버지가 그날 유독 더 길게 설명한 성어가 평생 가슴에 남는다. ‘출곡반면(出告反面)’이다. 원문은 ‘범위인자지례 출필곡반필면(凡爲人子之禮 出必告反必面)’이다. ‘예기(禮記)’의 곡례상(曲禮上) 편에 나온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는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뵙고 인사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어딜 가면 어디로 언제 가는지, 돌아왔으면 얼굴을 보여주고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라는 말이다.
아버지는 “옛 어른들이 서당 다니다 천자문을 떼고 나면 배우던 ‘사자소학’에도 ‘출필곡지(出必告之)하고, 반필면지(返必面之)하라’고 실려 있다. 심지어 옛날엔 뒷산에 조상 묘가 있으면, 그 앞에 서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갔다. 돌아와서도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게 예의다”라고 덧붙였다. 내가 “학교에서 ‘출필고 반필면’은 배웠습니다”라고 말했다가 바로잡혔다. 아버지는 “‘곡(告)’은 단순히 알린다는 뜻이 아니다. 뵙고 청한다는 의미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하는 예의가 담긴 말이다. ‘알릴 고(告)’가 아니라 여기서는 ‘청할 곡(告)’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일러줬다. 그러나 고등학교 국어 시험 한문 독해에 이 문제가 나와 자신만만하게 ‘출필곡반필면’으로 썼으나 틀렸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서 효는 출발한다. 외출할 때 알리고, 돌아와 안부를 전하는 일상이 바로 효의 기본이다. 부모는 자식의 행선지를 알아야 안심한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책임을 배운다. 아버지는 “효는 먹이고 입히는 봉양만이 아니다. 부모 마음을 근심에서 놓아드리는 것이다. 출필곡반필면은 부모를 안심시키는 태도이자 효도의 핵심이다”라고 효의 본질을 정의했다. 이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조건이 없다. 자식은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 효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사회의 근본을 지킨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에서도 효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가족구조가 변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효도는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부모의 걱정은 단순히 불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식이 독립했더라도 그 소중함은 줄어들지 않는다. 아버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부모임을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며 이 작은 실천 강령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효는 옛말이 아니다. 부모를 안심시키는 것이 곧 사랑을 전하는 길이다. 손주에게도 물려줘야 할 가르침이다. 효를 가르치려면 명령보다 공감이 필요하다. “너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를 묻는 일이다. 그렇게 공감력을 기르고, 자기 행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가족끼리 안부를 숨기지 않는 소통의 전통도 이어져야 한다. 효는 마음의 예절이다.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이자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