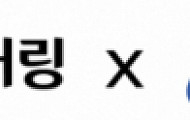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노인돌봄 현장에서 활약 중인 요양보호사 한 명을 만났다. 주인공은 케어링 주간보호센터 의왕점에서 근무 중인 이시윤(64) 팀장. 대기업 납품업체에서 관리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그는 전혀 다른 분야인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뛰어들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머니의 병간호였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더 잘 돌볼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죠. 2015년에 자격증을 땄지만, 그때는 막상 현장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처음 접한 요양원 실습 현장은 쉽지 않았다. 과도한 노동 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는 달랐다. 어르신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그는 2019년부터 요양보호사로서의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진짜 돌봄은 어르신과의 관계서 나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돌봄은 결국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처음엔 치매 어르신들의 반복 질문이 부담스럽고 때론 지치기도 했다. “하루에 수십 번 같은 질문을 하세요. 처음엔 저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그게 병의 특성이란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안쓰럽고 정이 가더라고요.”
이 팀장은 돌봄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임을 강조했다. “센터에 오시는 90세 어르신 중에는 머리 세팅을 안 하면 등원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매니큐어를 발라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남자 어르신들도 의외로 네일아트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웃음이 나고 하루가 즐거워요.”

과거엔 ‘아줌마’, ‘도우미’라 불리며 존중받지 못했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최근엔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젠 대부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고, 보호자분들도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세요. 그럴 때면 직업적인 자부심을 느끼죠. 제가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큰 보람은 어르신들의 변화다. “처음 센터에 오실 때는 무표정하셨던 어르신이 시간이 흐르며 표정이 밝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고마워요’라는 말씀을 건네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돌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
중년 여성들에게 요양보호사 일이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면 새롭게 시작할 직업을 찾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여성으로서 가진 돌봄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특히 주간보호센터는 체력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통을 좋아하는 분들께 아주 잘 맞는 일입니다.”

그는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일을 자주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가볍게 퇴근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는 일이죠. 나이 들어서 할 일이 마땅치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가족의 지지도 큰 힘이 됐다. 두 딸은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좋은 일 하니까 복 받을 거야”라고 격려한다. 그 말 한마디가 힘든 날을 견디게 해주는 위안이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돌봄이란 게 결국 어르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