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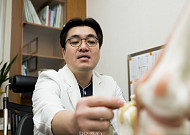
- 오십견, 평소 스트레칭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어
- “애 보느라 어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정형외과를 찾은 전농동에 사는 김OO씨는 오십대 후반으로 곧 환갑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다. 요즘 이런 환자분들이 늘고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정년퇴임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고 여가를 즐길 시점이지만 다시 할마 할빠로 재취업(?)을 하게 되신 분들 말이다. 당신들 손주니 어찌 안 예쁠 까만은 힘에 부치는 것은 어쩌지
- 2017-12-22 14:37
-

- 미당(未堂)과 추사(秋史)
-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이름을 중시하는 경명(敬名) 사상이 있었다. 따라서 이름은 군사부(君師父)가 아니면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이에 따르는 호칭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웃어른들이 자(字)를 지어주었는데 이렇게 지어진 ‘자’도 친구 등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부를 수 없었으므로, 누구나 편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별도로 필요해 만들어진 것이 호(號)
- 2017-12-20 20:37
-

- AI 시대 시니어의 ‘지호락’ 찾기,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 이어령(李御寧·83) 전 문화부장관은 언제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는 분이다. 이 시대의 멘토,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기억장치, 외장하드다. 어제 만났더라도 오늘 다시 만나면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가 샘솟는다. 그사이 언제 이런 걸 새로 길어 올렸을까 싶을 정도로 그에게는 늘 말이 차고 넘친다. 스스로 ‘아직도 비어 있는 두레박’, ‘여전히 늘 목이
- 2017-12-20 20:37
-

- 세면대 배수구에 마개가 빠진 날
- 집 가까이 전통시장이 있다. 원래 시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언젠가부터 앞에 전통이란 단어를 붙여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잘 있는 시장을 갑자기 우대하여 높여 부르는 건지 아니면 이제 퇴물이 되었다는 건지 아리송하지만, 아무튼 시장이 근처에 있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 신선한 채소를 싸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건값 에누리하는
- 2017-12-18 08:57
-

- 벤처창업 페스티벌
- 올해의 마지막 달력을 한 장 남긴 12월의 첫날 국내 최대 벤처창업 축제에 다녀왔다. 창업이라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식사업으로 생겼다 하면 얼마 안 가 간판이 바뀌고 가게가 없어지는 일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번 전시장에 와보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이렇게 많다는데 놀라기도 했고 뿌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 2017-12-14 09:04
-

- ‘나는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
-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가 됐다. 희끗희끗한 머리에다 깊이 파인 얼굴 주름을 더 이상 감추기 어렵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다. 오십견 때문에 팔을 들기 어렵고, 자고 일어나면 온 몸이 뻐근하다. 게다가 소화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다. 50줄에 들어서니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 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은 젊고
- 2017-12-13 20:26
-
- 남편의 퇴직 이후
- 우리 가족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이다. 저의 시부모님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동경 유학 생활 중에 만나서 당시로서는 드문 연애 결혼을 하셨다. 시어머님은 3남 1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던 중 6.25 전쟁의 발생으로 시아버님이 납치 되신 것이다. 어머님은 6·25당시 34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갖은 고생을 하시면서 자제분들을
- 2017-12-12 16:12
-

-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됐어요!
- 2017년 11월 29일 필자는 조달청의 초청으로 강릉 빙상장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상황과 조달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공급한 경기장을 돌아보며 경기장이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친절하신 조달청 대변인실 주무관의 설명으로 조달청은 이번 올림픽에 필요한 다양한 관
- 2017-12-11 18:04
-
- 프로필 사진, 이렇게 만들자
-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문서들이 많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등이 있고 프로필 사진도 그중에 하나다. 동년 기자라면 응당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다.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위 증명사진보다 자기의 특징이 잘 표현된 프로필 사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자기 홍보 시대를 살고 있어서 더 그렇다. 프로필 사진은 단정한 정면 얼굴
- 2017-12-11 12:16
-
- 못 이기는 척
- 필자가 몇 년 째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중구 노인대학에서 이 겨울이 끝나면 새 학기가 시작 된다. 새 학기가 되면 강의 시간도 조금 바뀌고 새로 생기는 강의도 있다. 필자는 강의 시간에 변동이 없어 지난 학기 학생이 거의 연속 수강을 하게 된다. 학생 중에는 몇 년을 다녀도 조용하게 별 존재감도 없이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선생인 필자에게 반찬을
- 2017-12-11 11:52
브라보 스페셜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2613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