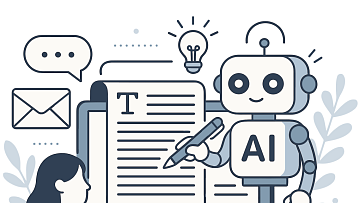-
![[함철훈의 사진 이야기] 풍류, 머무르지 않는 창조의 숨](https://img.etoday.co.kr/crop/190/135/926671.jpg)
- [함철훈의 사진 이야기] 풍류, 머무르지 않는 창조의 숨
- 풍류-이스탄불, 풍류-베이징, 풍류-밀라노, 풍류-홍콩에 이어 풍류-서울 전시회(7월 13일~8월 9일)를 포스코미술관으로부터 초대받았다. 자랑스러운 조상 덕이었다. 그중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유럽을 대표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유럽 예술과 패션의 중심지로 알려진 밀라노는 사진이 태동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도시가 2012년 9월 24일부터 말일까지를 ‘한국문화주일’로 선포했다. 우리 영화 등을 밀라노 상영관에서 개봉하고, 밀라노 광장에서 케이팝 공연과 한글을 소개하는 문화행사
- 브라보마이라이프 2016-08-24
-
![[송유재의 미술품 수집 이야기] 기껍고 대견해하는 엄마의 얼굴](https://img.etoday.co.kr/crop/190/135/926687.jpg)
- [송유재의 미술품 수집 이야기] 기껍고 대견해하는 엄마의 얼굴
- 대전의 보문산(寶文山) 사정(沙亭)공원에는 시비(詩碑)들이 있어, 언제 가도 느리고 깊은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1879~1944)의 이란 시가 발길을 붙잡는다. ‘출세의 해탈도 꿈입니다.’ 가슴에 꽂히는 구절을 새기며 추수 김관식(秋水 金冠植·1934~1980)의 를 읽는다. ‘저는 항상 꽃잎처럼 겹겹이 에워싸인 마음의 푸른 창문을 열어 놓고,’ 하늘을 바라본다. 다시는 못 올 눈물의 서정시인 박용래(朴龍來·1925~1980)의 ,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
- 브라보마이라이프 2016-08-24
-

-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는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드라마에서도 보이고 커피숍에서도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자들 대화에서 종종 들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전철”을 발음할 때 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혀끝만 사용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성대를 울려서 입모양과 얼굴 근육을 이용해서 발음이 나온다. 그런데 얼굴 근육도 안 움직이고 입 모양도 거의 안 움직인다. 성대를 울리기보다 간단히 내뿜는 호흡을 사용해서 발음하기 때문에 영어의 ‘Z' 발음이 난다. 겉멋인지는 몰라도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다. 말투도 빨라서 너무
- 강신영 시니어기자 2016-08-22
-

- 모두가 청춘이 되는 곳 방비엥
-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방비엥. 작은 시골 마을은 여행자들로 넘쳐났다. 커다란 배낭을 등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 여행자들 사이로,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바지에 쪼리를 신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다. 골목골목마다 튜빙이나 카약 등 액티비티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여행객들은 길거리 상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먹으며 다음날 즐길 거리를 예약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유럽의 배낭여행자들에게 인기있던 방비엥은 지난해 ‘꽃보다 청춘’ 방영 이후로 한국사람들에게도
- 최은주 시니어기자 2016-08-17
-

- 경기에 쇼맨십 필요하다
- 올림픽 유도 경기를 볼 때마다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쇼맨십 부족이다. 이번 리우 올림픽도 마찬가지이고 그전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대회 등 다른 대회에서 세계 1위 내지는 상위권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올림픽에서는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것이다. 해설을 맡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다른 나라 선수들은 세계 상위급인 우리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수없이 보면서 연구했는데 우리는 하위권 선수들 연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분석하기로는
- 강신영 시니어기자 2016-08-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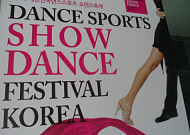
- 댄스스포츠의 새 장을 열다 - 제1회 대한민국 댄스스포츠 쇼 댄스축제
- 댄스스포츠의 새 장을 열다 - 제1회 대한민국 댄스스포츠 쇼 댄스축제 8월13일 이천 종합운동장 눈높이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제 1회 대한민국 댄스스포츠 쇼 댄스 축제’가 펼쳐졌다. 댄스스포츠란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로트, 비에니즈 왈츠의 모던 댄스와 자이브, 차차차, 룸바, 삼바, 파소도블레의 라틴댄스를 말한다. 총 10종목이다. 댄스스포츠는 생활체육으로도 즐기지만, 엘리트 체육의 요소도 있어서 경기대회와 쇼 댄스처럼 공연 부문도 있다. 그나마 본격적인 댄스스포츠를 감상할 기회는 경기대회에 가서 선수들의 경연을 보는
- 강신영 시니어기자 2016-08-17
-

- 로마여행
- 크루즈 여행의 현지투어로 로마를 갔다. 로마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 많이 알려진 곳이다.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펙이 주연한 영화「로마의 휴일」의 배경이기도 하다. 2000년 가까이 보존되어 있는 콜로세움이 눈에 들어 왔다. 이곳은 독립하기 위해 로마 지배에 반역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끌려 온 포로들에 의해 8년에 걸쳐 세워졌다고 한다. 포로들의 피와 땀의 결실물이다. 시민의 불평과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용된 원형경기장이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을 신앙 때문에 맹수의 밥으로 희생되었고 검투사는 시민의
- 최원국 시니어기자 2016-08-17
-

- 크루즈 여행
- 말이 씨가 된다고 8년 전에 친구들과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크루즈 여행을 친구 3가족과 같이 6월 초에 다녀왔다. 8년 이상 적금을 들어 준비한 것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처음에는 알래스카로 가기로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서지중해로 변경되어 10일 동안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비행기로 가서 배로 제노아, 로마, 시칠리아섬, 몰타, 스페인의 팔마 드 마요르카, 발렌시아, 프랑스 마르세이유를 여행했다. 하나 여행사를 통해 갔는데 10명이상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을 힘들게 부탁해서 6명이 갔다. 돌아와서 만난 지인에
- 최원국 시니어기자 2016-08-16
-

- 백두산 기행
- 회갑기념으로 4박5일 일정으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다. 심양까지 비행기로 1시간 10분 동안 간 다음 버스로 통화, 집안, 이도백화를 거쳐 백두산까지 가는 여정이다. 버스로 무려 8시간 이상 걸리는 힘든 여행이다. 백두산 여행의 백미는 천지를 제대로 보는 것에 있다. 수시로 변화하는 날씨로 안개가 끼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백두산 여행은 기온관계로 6-9월 4개월간만 가능하다. 같이 간 친구 중 한 명은 활화산인 백두산이 20년 내에 폭발할지 몰라 만사 제쳐두고 참여했다고 한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주위는
- 최원국 시니어기자 2016-08-16
-
![[라오스여행] (1)툭툭, 손님을 부르는 소리](https://img.etoday.co.kr/crop/190/135/921915.jpg)
- [라오스여행] (1)툭툭, 손님을 부르는 소리
- 라오스여행은 출발 이틀 전에 결정됐다. 딸 친구가 아파서 못가게 된 자리에 무임승차 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없었던 탓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을 나섰다. 갑작스레 준비된 이 여행은 ‘꽃보다 청춘’에서 나피디가 비행기표 한 장 달랑 주고 킥킥거리며 웃던 그 여행을 닮았다. 밤비행기를 타고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도착했다. 방비엥과 루앙프라방에 가기 위해서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공항에 도착해 호텔까지 택시를 탔다. 하룻밤을 보내고 비엔티엔에 가기 위해 여행자거리로 나섰다. 여행자거리는 한산했다. 짐을 들고 지나는 우리를 향
- 최은주 시니어기자 2016-08-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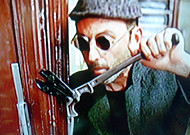
- 레옹 (Leon, Léon)
- 레옹 (Leon, Léon) 1994년에 만든 영화이다. ‘니키타’, ‘택시’. ‘테이큰’ 시리즈를 만든 유명한 뤽베송 감독 작품이며 킬러 레옹 역에 장 르노, 가족의 복수를 꿈꾸는 소녀 마틸다 역에 나탈리 포트만이 데뷔작으로 나온다. 프랑스 영화로는 드물게 개봉 당시 1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다. 아직도 평점이 10점 만점에 가깝게 매겨져 있고 18년 만에 재개봉되어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레옹의 옆집 소녀 마틸다가 심부름 갔다 왔는데 온 가족이 몰살 당한다. 12살 마틸다는 킬러 레옹에게 도움을
- 강신영 시니어기자 2016-08-11
-

- 화이트 타이거: 최강 전차군단(White Tiger, Белый Тигр)
- 화이트 타이거: 최강 전차군단(White Tiger, Белый Тигр) 러시아의 카렌 샤흐나자로프 감독이 만든 전쟁 영화이다. 주연에 비탈리 키시쳰코, 알렉세이 베르트코프, 블라디미르 일린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알려진 배우들은 아니다. 배경은 2차 세계 대전이다. 소련이 베를린을 향해 진군해 나가던 시기였다. 소련군은 탱크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군인 한명을 발견한다. 신체의 90% 화상을 입게 되면 대개 사망하는데 이 병사는 놀랍게도 빠른 회복을 보인다. 그래서 소위로 임관되어 다시 탱크에 타게 된다. 이 무렵 독일
- 강신영 시니어기자 2016-08-11
-

- 말레피센트
- 누구나 어린 시절 동화책을 많이 읽고 자란다.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백설 공주, 인어공주, 잠자는 숲 속의 미녀나 전래동화로는 해님 달님, 콩쥐 팥쥐, 장화홍련전, 흥부 놀부 등이 있다. 재미있는 건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동화의 내용이 비슷한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 나쁜 새엄마와 의붓언니에게서 구박받으면서도 씩씩하게 견디어 드디어 왕자님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신데렐라도 우리나라의 콩쥐 팥쥐와 같은 내용이어서 흥미롭다. 나라가 달라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 박혜경 시니어기자 2016-08-11
-
![[출판기념회] 왕희지는 왜 난정에서 연회를 열었을까? 천하제일행서 <난정서>를 해부하다!](https://img.etoday.co.kr/crop/190/135/912658.jpg)
- [출판기념회] 왕희지는 왜 난정에서 연회를 열었을까? 천하제일행서 <난정서>를 해부하다!
- 지난 7월 7일 서울 종로 마이크 임팩트 12층 C호실에서 하태형 수원대학교 금융공학과학대학원 교수는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난정으로 떠나는 중국 귀족문화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난정연회(蘭亭宴會)란 중국 동진시대의 명필 왕희지(王羲之)가 난정(蘭亭)이라는 곳에서 주최한 연회를 말한다. 이 연회에서 동양 최고의 행서(천하제일행서)라고 불리는 서예작품 가 탄생했다. 난정연회에 참석한 당대의 명사들이 각각 시를 짓고, 그 시를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 이다. 그리고 그 책의 서문
- 브라보마이라이프 2016-08-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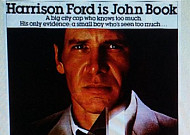
- 해리슨 포드의 영화 ‘위트니스’ 감상기.
-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영화관에 가실 때마다 필자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래서일까? 필자는 영화 보는 걸 무척 좋아한다. 영화라면 장르에 상관없이 다 좋아하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주제인 좀비라던가 와장창 때려 부스는 영화는 별로이다.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가 많지만, 영화를 생각하면 어릴 때 보았던 아름다운 한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어떤 영화였는지는 기억에 없어도 한겨울 예쁜 아치 모양의 다리 밑에서 한껏 차려입은 남녀가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이다. 남자들은 정장을 차려입었고 여자들은 허리가 잘록 들어간 긴 치마의 투피스 차림으로
- 박혜경 시니어기자 2016-08-08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