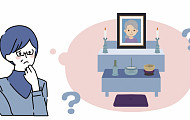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인 ‘산분장(散粉葬)’이 제도화되는 가운데, 해당 계획을 놓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장례 방법으로서의 산분 방식을 구체화하고, 2024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간점유가 없는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묘지나 봉안 시설 공간 부족을 해소해 지속 가능하고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분을 하는 공간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 등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분장 제도화 시행에 대해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좋은 움직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시신을 땅에 묻는 기존의 매장과 불에 태우는 화장 방식에서 발전한 수목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목장은 국토는 그대로인데 매장이나 납골에 필요한 묘지 면적은 확대됨에 따라 목초지, 주거지가 훼손되거나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0년대 초반 도입됐다. 도입 직후에는 공동묘지나 납골당보다 거부감 없는 분위기와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점 덕에 환영받았으나, 높은 선호도에 따른 과도한 상업화와 고가의 비용, 일부 사립 수목장림의 불법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잇따른다.
김 대표는 “산분장의 제도화는 새 장묘문화의 길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가족들이 충분히 애도하고, 슬픔을 나눌 상징물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는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커다란 풍선에 유골을 넣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일본의 풍선장과 같이 산분장에서 더 나아간 형태의 장례 방식이 속속 나타나는 등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그만큼 다양한 고인의 생전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제도화에 앞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철영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의례는 한 국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이자 다음 세대와의 연결고리”라며 “하나의 장법을 정착시키려면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숲이나 강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가 아직은 고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버리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 정서상 부합하는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카드뉴스] 현명한 장례를 위해 유족이 고려할 사항들](https://img.etoday.co.kr/crop/190/120/1828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