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2017년이 밝아온다. 새해는 정유년(丁酉年)이다. 십이간지(十二干支)상 유(酉)는 닭에 해당하므로, 새해는 닭의 해이다. 우리는 흔히 酉자를 닭과 연결해 생각하지만, 사실 한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자이다.
따지고 보면 십이간지를 나타내는 열두 글자가 동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들이었다. 이 십이지를 쥐[子] 소[丑] 범[寅] 토끼[卯] 용[辰] 뱀[巳]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돼지[亥] 등 열두 마리의 동물과 결합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戰國時代)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이 동물과 연관 지은 것은 동물을 숭배하는 중국의 토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러면 酉자의 기원은 무엇일까? 일단 갑골문을 보면 이 글자는 술병을 나타내는 글자로 등장한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이 글자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이룬다[就]는 뜻이다. 8월이 되어 서리[黍]가 익으면, 술을 진하게[酎] 담글 수가 있다[就也。八月黍成。可爲酎酒。].”
후한(後漢)시대 허신(許愼)이 저술한 <설문해자>의 내용은 간단하다. 이를 풀이한 청(淸)대 단옥재(段玉裁)의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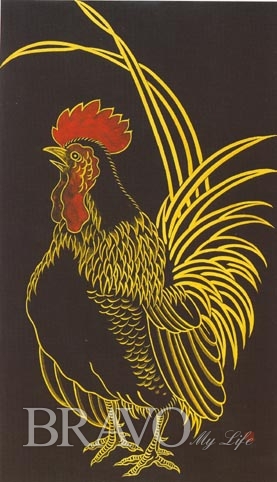
“서리는 대서(大暑)가 지나 이삭이 패서, 8월이 되면 익는다. 대개 벼[禾]과에 속한 곡물들은 8월이면 익는데, ‘벼[禾]’라고 하지 않고, ‘서리[黍]’라고 얘기한 것은 당시 술을 담글 때 주로 서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술을 진하게[酎] 담근다는 것은 세 번 빚는다는 것이다. 술을 묵힐 때는 반드시 술병[酉]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유(酉)’가 곧 ‘이룬다[就]’는 의미와 같게 쓰인 것이다. [黍以大暑而穜。至八月而成。猶禾之八月而孰也。不言禾者、爲酒多用黍也。酎者、三重酒也。必言酒者、古酒可用酉爲之。故其義同曰就也。]”
당시에는 하력(夏曆)을 사용하였는데, 하(夏)나라 때 사용한 하력은 오늘날 태음력(太陰曆)에 해당하므로, 당시의 8월은 오늘날 양력 기준 9월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詩歌)인 <시경(詩經)>의 빈풍(豳風). 칠월(七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가을에 거둔 쌀로 봄날 술[春酒]을 담가서, 노인들 장수를 빌어보네[爲此春酒 以介眉壽].”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서인지, 당(唐)나라 때부터는 아예 술을 지칭할 때 ‘춘(春)’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당국사보(唐國史補)>에, ‘영주(郢州)에서 나는 술을 부수춘(富水春)이라 부르며, 조정(烏程)의 술은 약하춘(若下春), 영양(滎陽)은 상굴춘(上窟春), 부평(富平)은 석동춘(石東春), 검남(劒南)은 소춘(燒春)이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춘주(春酒)중 세 번 담가서 진하게 빚은 술을 ‘춘주(春酎)’라고 하며, 고급 술로 쳤다. 조선시대 동정춘(洞庭春), 호산춘(壺山春) 등 명주가 이런 전통을 따랐다.
새해는 정유년이니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이 이루어지는[就]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새로 빚어진 한국의 역사를 담는 술병[酉]같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문화공감-오늘의 할인티켓] 퍼커셔니스트 한문경 귀국 리사이틀 '오푸스 비르투오조 시리즈' 등](https://img.etoday.co.kr/crop/85/85/465670.jpg)
![[한문 산책]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의 한문(漢文) 산책](https://img.etoday.co.kr/crop/85/85/573654.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봄을 노래한 한시(漢詩)](https://img.etoday.co.kr/crop/85/85/608741.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난정서(蘭亭序)](https://img.etoday.co.kr/crop/85/85/627145.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https://img.etoday.co.kr/crop/85/85/642442.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대나무 사랑](https://img.etoday.co.kr/crop/85/85/660974.jpg)
![[한문산책] 대나무 사랑](https://img.etoday.co.kr/crop/85/85/662169.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중국과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들](https://img.etoday.co.kr/crop/85/85/682926.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추양부(秋陽賦)](https://img.etoday.co.kr/crop/85/85/703476.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가을이면 생각나는 명문장 등왕각서(縢王閣序)](https://img.etoday.co.kr/crop/85/85/724297.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가을의 소리[秋聲]](https://img.etoday.co.kr/crop/85/85/741163.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제야와 세모](https://img.etoday.co.kr/crop/85/85/759806.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눈을 노래한 한시(漢詩)](https://img.etoday.co.kr/crop/85/85/784581.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읍견군폐(邑犬群吠), 온 고을 개가 다 짖으니](https://img.etoday.co.kr/crop/85/85/805725.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한정부(閒情賦)’ 아름다운 사랑 시](https://img.etoday.co.kr/crop/85/85/827128.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도망시(悼亡詩)](https://img.etoday.co.kr/crop/85/85/840829.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재조명](https://img.etoday.co.kr/crop/85/85/859934.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이제 지음(知音)을 잃었으니](https://img.etoday.co.kr/crop/85/85/876699.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그려](https://img.etoday.co.kr/crop/85/85/893979.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장면(牆面)과 면장(免牆)](https://img.etoday.co.kr/crop/85/85/912653.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가을, 등화가친의 독서 철](https://img.etoday.co.kr/crop/85/85/928485.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https://img.etoday.co.kr/crop/85/85/945447.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김영란법과 청백리(淸白吏)](https://img.etoday.co.kr/crop/85/85/961089.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뛰어난 신하는 물러날 때를 안다](https://img.etoday.co.kr/crop/85/85/1008255.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절절함을 노래한 시, 첫 번째](https://img.etoday.co.kr/crop/85/85/1024743.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도망시(悼亡詩),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https://img.etoday.co.kr/crop/85/85/1058039.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후목분장(朽木糞牆)’](https://img.etoday.co.kr/crop/85/85/11428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