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사용되는 사자성어 중 우리와 뜻을 달리하는 것들이 꽤 많다. 정확히는 우리나라로 들어와 뜻이 변질된 것들이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단어가 있다. 원전은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篇)으로,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께 물었다. “사(師:자장(子張))와 상(商:자하(子夏)) 중 어느 쪽이 어집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 “그럼 사가 낫단 말씀입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과유불급인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둘째, ‘좌고우면(左顧右眄)’이란 단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에 앞뒤를 재고 결단하기를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원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원전은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아들인 조식이 당시 위나라의 권신이었던 오질(吳質)에게 보낸 <여오계중서(與吳季重書)>다. 이 글에서 조식은 오질이 문무를 겸비하고 기상이 출중하여 고금을 통틀어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찬미하길,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살펴보아도[左顧右眄] 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이 어찌 그대의 호기로움이 아니리오!”라는 표현을 한다. 즉, 좌고우면은 원래 좌우를 살펴보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좌간우간(左看右看)’, 즉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 또는 ‘세간(細看)’, 즉 ‘자세히 살펴봄’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셋째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이다. 원래 당나라 오융(吳融)의 <상인(商人)>이란 시 가운데 ‘백척간두 위험한 곳에 동전 닷 냥 걸려 있어도, (그것을 벌려고 쫓아다니는) 상인이란 인생 길 어디선들 살지 못하리오’[百尺竿頭五兩斜 此生何處不爲家]에 나오는데, 이후 큰 학문적 업적 또는 고위 관직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송(宋) 나라 때의 고승 도원(道源)이,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이란 책에서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즉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도달한 뒤에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한 뒤로는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에도 더욱 노력하여 위로 향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넷째는 ‘주마간산(走馬看山)’이다. 중국에서는 이 단어 대신에 ‘주마간화(走馬看花)’라고 쓰는데, 그 원전은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등과후(登科后)>란 시이다. 맹교는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계속 떨어지다가 46세 되던 해에 드디어 등과한 후, 기쁜 마음에 이 시를 지었다. ‘전에는 이를 악물어도 급제할 수 없었는데[昔日齷齪不足花] 급제한 오늘은 천하가 다 내 것인 듯[今朝放蕩思無涯], 봄바람에 말을 마구 달려[春風得意馬蹄疾] 하루 만에 장안구경을 다 하였네’[一日看盡長安誇], 이런 내용이다.
즉, ‘주마간화’란 원래 ‘득의만만하여 유쾌한 모양’을 나타내었는데, 훗날 ‘하루 만에 장안구경을 한다’, 즉 ‘사물의 겉모양만 훑어본다’란 뜻으로 바뀐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바뀌는데, 어찌하여 바뀌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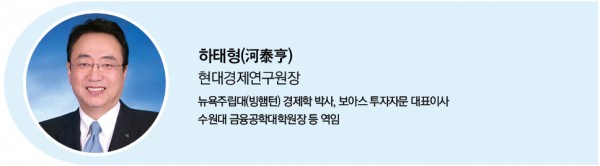


![[카드뉴스] 봄을 알리는 3월 전국 축제 리스트 9](https://img.etoday.co.kr/crop/190/120/2299200.jpg)



![[문화공감-오늘의 할인티켓] 퍼커셔니스트 한문경 귀국 리사이틀 '오푸스 비르투오조 시리즈' 등](https://img.etoday.co.kr/crop/85/85/465670.jpg)
![[한문 산책]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의 한문(漢文) 산책](https://img.etoday.co.kr/crop/85/85/573654.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봄을 노래한 한시(漢詩)](https://img.etoday.co.kr/crop/85/85/608741.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난정서(蘭亭序)](https://img.etoday.co.kr/crop/85/85/627145.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https://img.etoday.co.kr/crop/85/85/642442.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대나무 사랑](https://img.etoday.co.kr/crop/85/85/660974.jpg)
![[한문산책] 대나무 사랑](https://img.etoday.co.kr/crop/85/85/662169.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추양부(秋陽賦)](https://img.etoday.co.kr/crop/85/85/703476.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가을이면 생각나는 명문장 등왕각서(縢王閣序)](https://img.etoday.co.kr/crop/85/85/724297.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가을의 소리[秋聲]](https://img.etoday.co.kr/crop/85/85/741163.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제야와 세모](https://img.etoday.co.kr/crop/85/85/759806.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눈을 노래한 한시(漢詩)](https://img.etoday.co.kr/crop/85/85/784581.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읍견군폐(邑犬群吠), 온 고을 개가 다 짖으니](https://img.etoday.co.kr/crop/85/85/805725.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한정부(閒情賦)’ 아름다운 사랑 시](https://img.etoday.co.kr/crop/85/85/827128.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도망시(悼亡詩)](https://img.etoday.co.kr/crop/85/85/840829.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재조명](https://img.etoday.co.kr/crop/85/85/859934.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이제 지음(知音)을 잃었으니](https://img.etoday.co.kr/crop/85/85/876699.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그려](https://img.etoday.co.kr/crop/85/85/893979.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장면(牆面)과 면장(免牆)](https://img.etoday.co.kr/crop/85/85/912653.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가을, 등화가친의 독서 철](https://img.etoday.co.kr/crop/85/85/928485.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https://img.etoday.co.kr/crop/85/85/945447.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김영란법과 청백리(淸白吏)](https://img.etoday.co.kr/crop/85/85/961089.jpg)
![[한문산책] 정유년(丁酉年)](https://img.etoday.co.kr/crop/85/85/992663.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뛰어난 신하는 물러날 때를 안다](https://img.etoday.co.kr/crop/85/85/1008255.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절절함을 노래한 시, 첫 번째](https://img.etoday.co.kr/crop/85/85/1024743.jpg)
![[하태형의 한문산책] 도망시(悼亡詩),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https://img.etoday.co.kr/crop/85/85/1058039.jpg)
![[하태형의 한문 산책] ‘후목분장(朽木糞牆)’](https://img.etoday.co.kr/crop/85/85/1142876.jpg)










